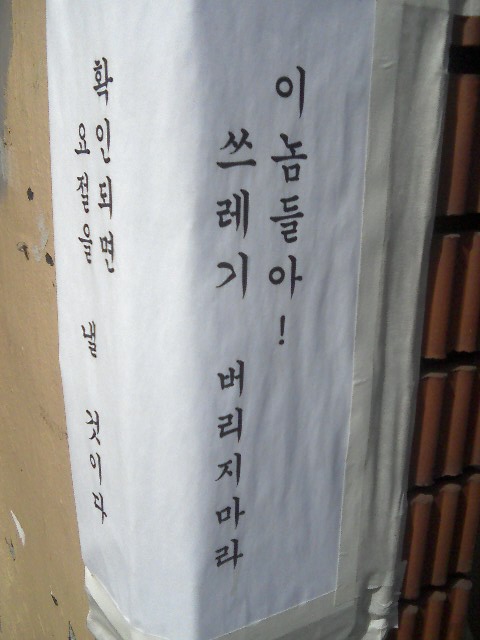'따뜻한' 사람들,이라 말할 때 하고 '뜨거운' 사람들, 이라 말할 때 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. 뜨거운 사람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는데, 뜻밖에도 따뜻한 사람은 쉬 만나지지 않습니다. 희귀종, 멸종위기종이랄 수 있겠습니다. 저는 이 멸종 위기에 빠진 '따뜻한' 사람을 몇몇 알고 있습니다. 저는 뜨겁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만 말입니다. 오히려, 차갑다는 평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만. 한 사람이 있습니다. 58년 개 띠입니다.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농부가 돼 있습니다. 이름을 대면 많은 이들이 아는, 꽤 이름난 시인이기도 한 사람입니다. 옛날 시내버스 승차권이 있던 시절입니다. 이 사람은 반드시, 꼭, 어떤 일이 있어도, 현금을 내고는 절대 시내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. 버스표 파는 데가 길 건너..